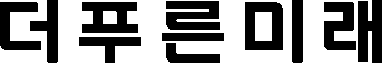차세대 태양전지용 덮개유리, ‘감광성 반도체 부품’ 아냐… 법원 “단순한 안전강화유리로 봐야”
태양전지판에 사용되는 특수 유리가 ‘반도체 부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강화유리로 봐야 하는지를 둘러싼 관세 분쟁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는 2025년 6월 12일, 태양전지 제조업체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합67321)에서 “이 사건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의 부분품이 아닌 안전강화유리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양전지 덮개유리, ‘0% 관세’ 노렸지만
A사는 중국에서 AR 코팅(반사방지막)과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유리를 수입해 태양전지판의 덮개(cover glass)로 사용해왔다. 이 유리는 빛 반사를 줄이기 위한 코팅과 패턴이 적용된 고급 제품으로, A사는 이를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HSK 8541.90-9000)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 WTO 양허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10억 원, 부가세 1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관은 해당 유리를 ‘안전유리 중 강화안전유리’(HSK 7007.19-1000)로 분류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세심판원 역시 2024년 3월 8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태양전지의 ‘부분품’이라 보기 어려워”
법원은 먼저 관세법상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물품의 객관적 특성, 기능, 가공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태양전지의 본질적 기능은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있으며, 이 사건 물품은 그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덮개유리가 없어도 전력 변환은 가능하다.”
재판부는 태양전지의 핵심 단위가 각각의 셀(cell)이지, 이를 덮는 유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유리가 수입 당시 독립된 판형 유리 상태로 반입된 점을 들어, ‘부분품’으로 보기 위해서는 제품과 결합된 형태로 제시돼야 한다는 HS해설서의 원칙을 언급했다.
결국 “덮개유리는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protector)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었다.
“AR 코팅·프리즘 패턴 있어도 여전히 유리”
A사는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이 단순한 표면가공을 넘어 고도의 광학기술이 적용된 가공이므로, 강화유리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유리나 스마트 냉장고 커버유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들 역시 AR 코팅이나 지문방지 코팅이 적용되었음에도 모두 제7007호(안전유리)로 분류된다고 판시했다.
즉, ‘고급 가공’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물품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다.
“AR 코팅과 프리즘 패턴은 제7007호에서 예정한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건 물품은 여전히 안전강화유리의 범주에 포함된다.”
분류 체계상도 ‘강화유리’가 타당
판결은 HS 품목분류의 전체 체계에 비추어도 이 유리가 제7007호(안전유리)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제70류는 유리를 형태(시트, 구, 막대 등)와 제조법(플로트법, 롤법 등), 가공 정도(단순·강화)별로 세분하고 있는데, AR 코팅이 된 강화유리는 모두 제7007호로 포섭된다는 것이다.
“AR 코팅이 된 판유리는 제7003~7005호의 범주에 들어가고,
여기에 안전강화 가공이 더해진 유리는 제7007호로 분류된다.”
결국 “정부의 분류가 옳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물품은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 납부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A사가 요구한 약 11억 원의 환급은 무산됐다.
사회적 의미
이번 판결은 첨단소재라 하더라도 그 기능이 주체 제품의 본질적 역할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부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 ‘고기능 유리’와 ‘반도체 부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관세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기술적 복합성보다는 제품의 구조적 위치와 본질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과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7321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