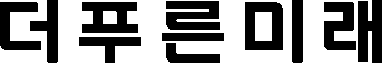‘팀장’이라 불렸지만… 법원 “지휘권 없는 명목상 관리자, 연장수당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회사의 항소 기각… “직책만 높을 뿐 실질은 근로자”
서울의 한 중견 유통업체.
오랜 기간 근무해온 한 남성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관리자라 불렸지만, 실상은 매일 매출 압박에 시달리던 일반 근로자였다.”
회사는 그를 ‘점장’이자 ‘팀장’으로 불렀고, 고정급 외 수당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었고, 매일 본사 보고에 시달렸다.
야간 재고조사, 주말 행사 준비, 매출 목표 독촉.
그는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회사는 그를 “관리직이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678 사건이다.
1심, “형식 아닌 실질이 중요하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매장 내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인사권·채용권·징계권 등 ‘실질적 지휘권한’은 없었다.
또한 회사의 근로자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시간을 기록했고,
매출 실적에 따라 평가를 받는 등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형태였다 .
재판부는 “명목상 ‘팀장’이라는 직책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미지급한 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회사 항소 “관리자급으로 봐야”… 법원은 “실질은 근로자”
패소한 회사는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회사는 “원고는 점포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인사와 평가에도 관여한 관리자”라며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포괄임금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직원 근태를 보고할 의무는 있었지만 승인권은 없었고,
매출목표·행사계획 등 주요 업무지시는 본사에서 하달되었다.
즉, 현장관리 역할은 수행했지만 “경영권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원고의 근무일지는 회사 서버에 자동 저장되었고,
월 250시간 이상 근로한 기록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단순 관리직이라면 이러한 근태관리 시스템의 통제 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의 결론 — “항소 기각, 체불수당 지급하라”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즉,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 측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직책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직책의 이름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이 기준”
이 판결은 최근 늘어나는 ‘명목상 관리자’ 논란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
유통, 금융, 외식 등에서 ‘점장’·‘매니저’라는 직책을 내세워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원은 “직책보다 실질”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중간관리자 계층을 보호하는 사법적 균형 조치”라고 평가한다.
즉, 지휘권이 없는 관리자는 여전히 노동자이며,
그 이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임금의 본질은 노동의 대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요약]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678
사건명: 임금 등
원고: 전직 점장 A씨
피고: 주식회사 B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2025. 2. 선고)
쟁점: 팀장·점장 직책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포괄임금제의 적용 가능성
이 기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678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