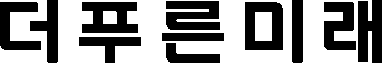[법률 문학관]Ep.01 <끝까지 남은 사람〉
[PROLOGUE]
사람은 누구나 죽음보다 두려운 순간이 있다.
그건 외로움이다.
곁에 있어줄 사람 하나 없이,
내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그 시간 말이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기침 소리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식은 죽을 식탁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데우는 일을 반복했다.
그런데,
그 식탁 옆에 늘 앉아 있던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였다.
[STORY – 1부 / 막내며느리의 자리]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서른여섯의 나이에,
그녀는 검은 상복보다 더 검은 고요 속에 남겨졌다.
그녀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시댁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병든 시아버지와 쇠약한 시어머니를
그녀가 돌보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는 종종 말했다.
“얘야, 넌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직 발자국이 따뜻한데요.
그 발자국 위에 제 하루를 놓을게요.”
[STORY – 2부 / 방기된 자식들]
그 집에는 아들 셋이 있었다.
장남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살았고,
둘째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했다.
그리고 막내 — 수진의 남편 — 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장남은 어머니에게 전화로 말했다.
“엄마, 수진이 잘하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둘째는 형보다 현실적이었다.
“요즘 매출이 바닥이에요. 병원비는 형이 좀 더 부담하시죠.”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없었다.
그들이 부모의 병세를 묻는 건
한 달에 한 번, 돈 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그럼에도
늘 자식들을 감쌌다.
“다들 바쁘잖니. 세상이 예전 같나.”
그 말에 수진은 말없이 밥숟가락을 놓았다.
대신 작은 미소로 어머니의 말을 받아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미소가 거짓말을 덮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STORY – 3부 / 아버지의 죽음과 유산의 그림자]

그해 겨울,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
의사는 말했다.
“며칠을 버티시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건 수진뿐이었다.
다른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네 덕분에, 덜 외로웠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장례식날,
모두가 모였다.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향 냄새보다
계산기 냄새가 더 진하게 났다.
“형님, 상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대로 해야지. 배우자 1.5, 자녀들은 균등하게.”
“그럼 수진이는요?”
“며느리는 상속권 없잖아.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 말이 정답이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이렇게 정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공동상속인,
며느리나 사위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산은
형제들에게만 나뉘었다.
집 한 채, 예금 통장, 땅 서류까지
모두 도장 하나로 끝났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흰 국화꽃을 향해 절을 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울음을 삼켰다.
[STORY – 4부 / 남겨진 어머니와 며느리]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다시 각자의 도시로 흩어졌다.
어머니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단 한 사람, 수진만 빼고.
그녀는 어머니의 식탁을 다시 차렸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니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다.”
“내일은 병원 다녀오실게요.”
그 평범한 대화가
그들 둘의 하루를 이어줬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의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죠? 병원비는 형님이 더는 못 낸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다들 바쁘대요.”
그 말 뒤엔 길고 따뜻한 침묵이 따라왔다.
[STORY – 5부 / 어머니의 깨달음]
어머니는 세월 속에서
눈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졌다.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장남의 아내가 보낸 문자를 보았다.
“이제 어머니 유산도 없는데,
굳이 챙겨야 할 필요 있나?”
그 문장을 본 순간,
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그동안 감싸왔던 착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둔 유언장이었다.
“내가 죽은 뒤,
내 몫의 예금 절반은 수진에게 준다.
법은 모르지만, 마음의 법은 그렇게 정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그 사람, 역시 내 마음을 알았구나.”
[STORY – 6부 / 마지막 상속]

며칠 후,
어머니는 수진을 불렀다.
“얘야, 이건 네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저한테요?”
“응. 네가 우리 집의 자식 노릇 다 했잖니.”
수진은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같이 산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그래도, 이건 네가 받아야 해.
법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
어머니는 유언장과 함께
작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수진은 끝내 받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받아둬. 나 죽고 나면,
자식들이 다시 찾으러 올지도 몰라.”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있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아직 따뜻했다.
[EPILOGUE]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모여서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가 말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에 따라,
남편 명의 유산의 일부는 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1066조에 의거,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형제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진실은 명확했다.
법은 피로 맺은 관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삶은 마음으로 맺은 관계를 남긴다.
며칠 뒤,
수진은 법무법인에서 받은 서류를
그대로 봉투에 넣어 어머니 영정 앞에 올려두었다.
“어머니, 저 이건 안 쓸게요.
그저 어머니가 웃던 그날의 손길만 기억할게요.”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빗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네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녀의 걸음소리는 가벼웠고,
방 안에는 어머니의 향 냄새가 남았다.
[AFTER STORY / 현실법 해설 코너]
🎙️
이야기가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착한 며느리 수진은 유산을 받을 수 없었을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시부모를 돌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이제부터 짧게, 현실의 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1️⃣ 법정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한국의 상속법은 ‘혈연과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사망자의 재산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핵심:
며느리나 사위는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집안의 상속권에서 법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진처럼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시부모가 사망해도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2️⃣ 예외 – 유언(遺言)에 의한 상속 (민법 제1066조)
하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의사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효력이 있다.”
즉, 아버지가 “내 예금의 절반을 수진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면,
그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 요약: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현실에서의 분쟁
실제 사례에서도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한 며느리나 사위가
“기여분(寄與分)”을 주장해 일부 재산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법 제1008-2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는
그 기여분을 상속분에 가산한다.”
다만, 기여분은 ‘법적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수진처럼 직계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는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① 생전 증여 또는
② 유언장을 통한 지정 상속입니다.
⚖️ 4️⃣ 현실적 교훈
📘
“효도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마음이 인정받으려면 기록이 필요하다.”
법은 감정을 재단하지 않지만,
문서(유언, 위임장, 증여계약)는 감정의 흔적을 증거로 남깁니다.
따라서
- 시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보답을 원한다면 공증 유언장을 남겨야 하고,
- 간병을 맡은 가족이라면 기여분 관련 증거(의료비·간병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마무리 – “법과 마음의 교차점”
수진의 시아버지는 법을 몰랐지만,
‘마음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필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마음의 법은 그렇다.”
그 한 줄이,
인간의 정의가 법보다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 이야기로 배우는 인생법 – 인생 문학관
오늘의 교훈입니다.
“상속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증거가 남는다.”
📚 [요약: 이번 이야기에서 배운 상속법]
| 항목 | 내용 |
|---|---|
| 민법 제1000조 | 상속은 배우자 + 자녀가 1순위. 며느리는 남편 사망 시 상속권 없음. |
| 민법 제1066조 | 자필 유언장은 법적 효력 있음. 혈연이 아니어도 지정 가능. |
| 민법 제1008-2조 | 기여분 제도: 공동상속인만 청구 가능. 며느리 단독 청구는 불가. |
| 실무 팁 | 생전 증여 또는 공증 유언장으로 ‘마음의 상속’을 남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