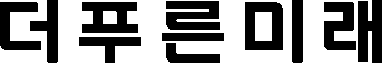“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轉籍)은 무효”… 법원, 국민연금공단의 강제 전환 ‘제동’
서울중앙지법 “법률상 근로관계 포괄승계 인정 어렵다… 보전필요성은 부족”
2009년 봄, 정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를 본격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으로 나뉘어 있던 보험료 징수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9690호)은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 업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했다.
이 결정은 곧 인사 갈등으로 번졌다.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 712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 대상이 되자, 일부 직원들은 “근로자 동의 없는 강제 전적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들은 “우리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국민연금공단인데, 동의 없이 다른 기관 소속으로 옮기라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 개정으로 업무 이관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까지 자동 승계는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이번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일방적 인력 전환에 대해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업무이관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용주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전환 대상을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고용승계를 허용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업무의 이전과 고용관계의 이전은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은 “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의 ‘공단으로 전환된 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는,
전환이 결정된 이후 별도 절차 없이 임용된다는 의미이지,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근로자 지위 영향 있지만 손해 현저하지 않아”… 가처분은 기각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환 과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측면은 있으나,
정년·근로조건 등에서 실질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무 희망지역이 동일하거나 기존 근무권역 내에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손해나 즉각적인 해고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강제 전환 자체의 법적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즉시 멈출 만큼의 ‘긴급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해당 근로자들의 본안 소송(전환 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환 인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공공기관 통합의 그늘”… 근로계약 존중의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통합 과정에서 ‘법적 고용승계’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판례(1994다58714, 2003다39644 등)를 인용하며,
법원은 “공공기관 간의 통합이 행정 효율화를 위한 입법정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 그 동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형식적 절차보다 근로자 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했다.
반면 공단 측은 “국가 차원의 조직 개편은 개인적 의사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건 요약]
사건명: 강제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616
신청인(채권자):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 4인
피신청인(채무자): 국민연금공단
주요 쟁점: 근로자 동의 없는 인력 전환의 효력
결론: 신청 기각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이지만 보전필요성 부족)
결정선고: 2010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