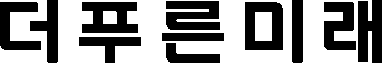구직급여 607만원 받은 뒤 신고 지연… 法 “2개월 지나면 지급자격 상실”
“형식 요건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실업인정 신고 지연으로 부지급 처분 정당
2022년 초 직장을 그만둔 A씨는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이어갔다.
네 차례에 걸쳐 총 6,072,000원을 수령한 그는, 다섯 번째 실업인정일(6월 9일)을 앞두고 한창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새 직장을 구해 6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 바쁜 와중에 그는 한 가지 행정 절차를 놓쳤다. 바로 ‘실업인정 신고’였다.
그는 재취업 후 2개월이 지나서야 고용센터에 관련 신고를 했고, 결국 고용노동청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 항변한 원고
A씨는 이 처분에 반발했다. “실질적으로는 구직급여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단순히 형식적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직 기간 동안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실업인정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급여를 끊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2개월 내 신고는 유리한 예외 규정일 뿐”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2025년 5월 14일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직급여는 단순한 생계보조가 아니라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법이 정한 절차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요건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3호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특례 규정일 뿐”이라며, “이 기한을 넘겼다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즉, 2개월 규정은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완화조치’라는 것이다.
전화 통화로 신고했다는 주장도 인정 안 돼
A씨는 또 “실업인정일 이전인 6월 7일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출석 신고 또는 서류 제출·전자신고만을 정식 신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A씨가 주장한 모든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2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며 고용센터의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사회보장제도라도 절차의 성실성이 전제돼야”
이 사건은 행정절차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임을 다시 일깨운다.
법원은 “고용보험은 국가 재정과 사회적 신뢰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지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2024구합62357 판결문(2025.5.14. 선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서사적으로 각색한 기사입니다.